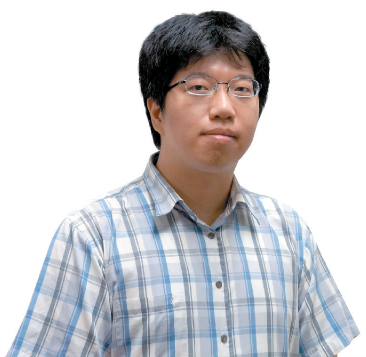
지난 11일, 미국 LA컨벤션센터에서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E3' 2013이 성대한 막이 올랐다.
‘E3’는 전 세계 게임 업체들이 신작 게임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로, 대기업은 물론 인디게임 개발자들까지 참가해 게임 트렌드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올해 E3 역시 총 221개 업체에서 209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다양한 신작과 신기술을 선보이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 기업도 13개 업체가 참가해 전 세계 게임 유저와 게임 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게임에 대한 어필과 수출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축제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모 언론매체에서 'E3'를 트렌드를 읽지 못했다는 평과 함께 반쪽짜리 행사로 폄하한 것이다.
발언의 요지는 '작년에 비해 모바일 게임의 비중도 줄고 업체 또한 모바일게임 업체 또한 참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산업이 축소되고 있는 콘솔게임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은 현재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이 보여준 경이로울 정도의 급성장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했다 하더라도 전 세계 게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콘솔 게임 시장은 무시할 만한 규모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이런 트렌드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10년도 전에 E3에서 나온 바 있다. 바로 콘솔 게임과 PC 온라인 게임과의 트렌드 교체기 끝에 E3에서 콘솔 게임을 보기 힘들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로 그 당시 트렌드는 인터넷을 활용한 멀티플레이 PC 게임이나 MMORPG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게임이었기 때문에 이 의견은 거의 정설로 받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E3의 최대 이슈는 'X박스원'과 'PS4'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콘솔시장 경쟁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기술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상용화단계로 접어들면서 가상현실 게임 환경과 모바일 게임 환경, 그리고 ‘인하우스’ 게임 환경으로 나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모바일 게임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게임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모바일이 아니면 뒤쳐지는 것'이라는 편협한 시선은 다시 고쳐봐야 하지 않을까?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