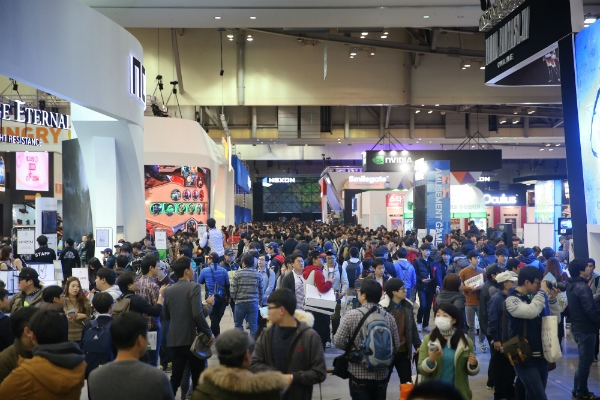
내수론 한계 ... 해외로 나가야
덩치싸움서 지지 않을 자금 필수…재 도약의 밑거름은 탄탄한 개발력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지상의 과제가 됐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와 업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많은 도전을 해왔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나마 넷마블게임즈와 엔씨소프트, 넥슨 등이 이름을 어느 정도 알렸을 뿐 아직도 경쟁업체들과 비교하면 한참 뒤쳐진 수준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계적인 게임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 방법으로 먼저 게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부정적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게임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위상이 올라가면 정부의 지원이 규제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토양에서는 자본금이나 매출을 급격히 키워나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지금까지 대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나 자동차 등 이른 바 오프라인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IT와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융복합산업이 급속히 커질 것이다. 그 최전방에 게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게임에 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014년 CJE&M에서 독립할 당시 텐센트로부터 5000억원을 투자 받아 분사하게 됐다. 이는 중국 최대 업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게임 업체들이 대형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수월치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후 넷마블이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대형 업체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덩치싸움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 했다. 특히 지난해 이스라엘의 소셜 카지노 업체 플레이티카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중국 컨소시엄에 밀려 기회를 놓쳤다.
우리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만큼 이 같은 사례 역시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자금을 융통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외국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업체들이 인수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게임판권(IP)이 외국업체에 넘어가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지분 투자를 비롯해 IP 확보까지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같은 위기를 벗어나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게임업체들의 경쟁력 자체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이나 투자가 아니라 작품을 성공시킴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막대한 자금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는 새로운 장르의 작품 '오버워치'를 성공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딩기업의 위상을 다시한번 증명해 보였다.

반면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들이 중국 등지에서 히트를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새로운 작품이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빅3 중 하나인 넥슨의 경우 지난해 의욕적으로 선보인 신작 ‘서든어택2’가 실패하면서 서비스 100여일 만에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년간 수백억원을 들인 프로젝트가 한 순간에 날라가 버린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넥슨뿐만이 아니었다.
또 1세대 개발자로 인정받아온 김학규의 이름을 건 ‘트리 오브 세이비어’와 송재경의 ‘문명 온라인’ 등 스타 개발자들이 내놓은 기대작들도 줄줄이 부진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는 단계에 내몰렸다. 때문에 글로벌 시장 개척 방법을 모색하기 앞서 우리 업체들 스스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매출과 규모의 확대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